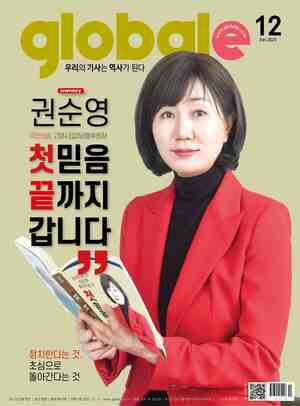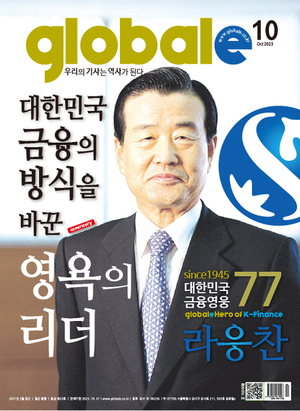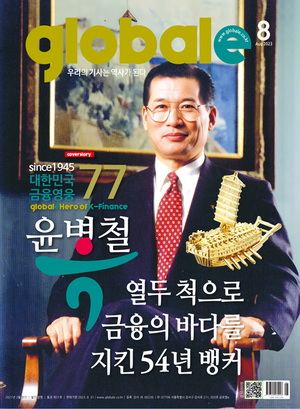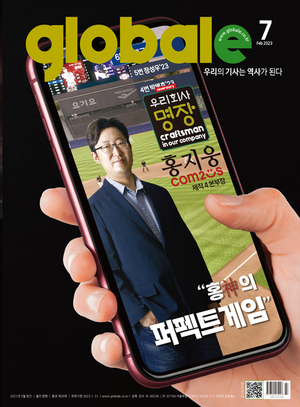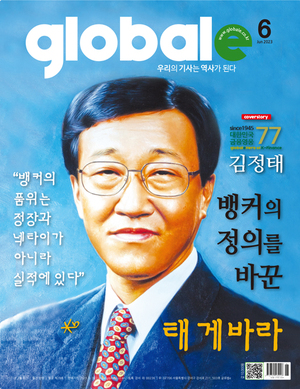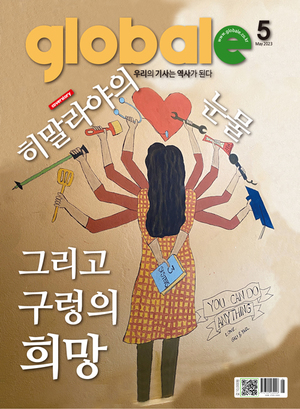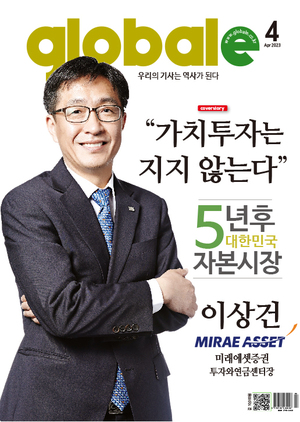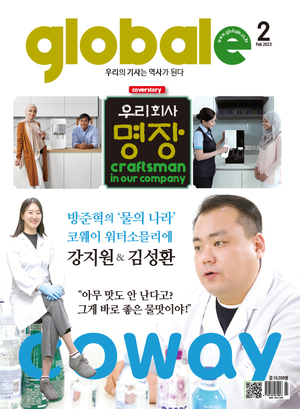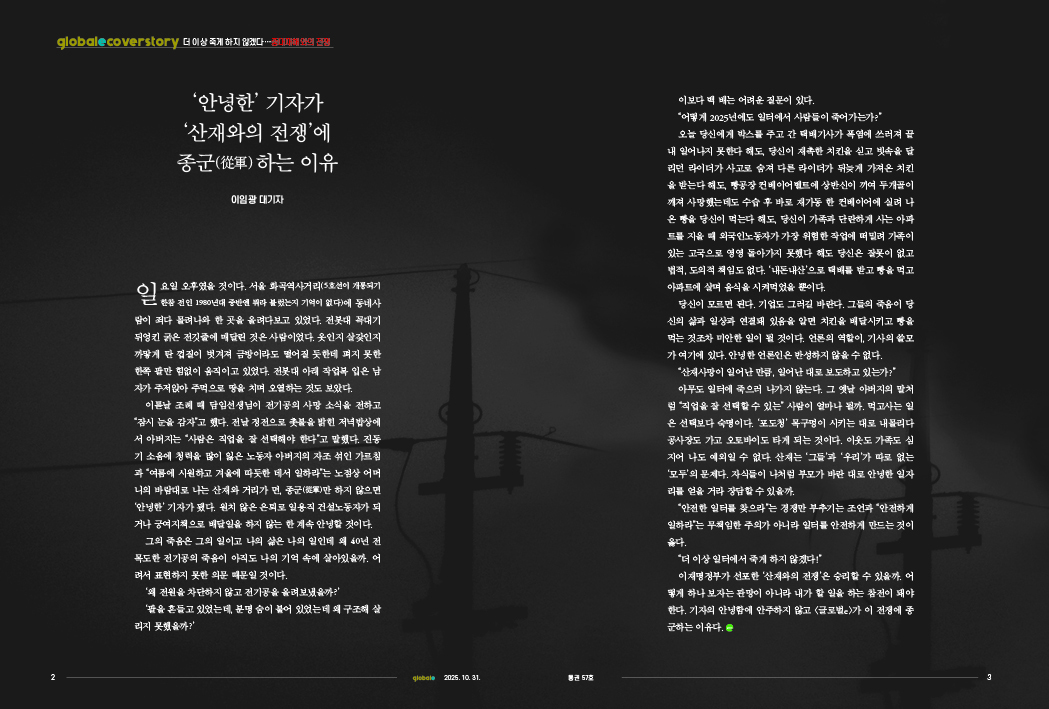
일요일 오후였을 것이다. 서울 화곡역사거리(5호선이 개통되기 한참 전인 1980년대 중반엔 뭐라 불렀는지 기억이 없다)에 동네사람이 죄다 몰려나와 한 곳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전봇대 꼭대기 뒤엉킨 굵은 전깃줄에 매달린 것은 사람이었다. 옷인지 살갗인지 까맣게 탄 껍질이 벗겨져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데 펴지 못한 한쪽 팔만 힘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전봇대 아래 작업복 입은 남자가 주저앉아 주먹으로 땅을 치며 오열하는 것도 보았다.
이튿날 조례 때 담임선생님이 전기공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잠시 눈을 감자"고 했다. 전날 정전으로 촛불을 밝힌 저녁밥상에서 아버지는 "사람은 직업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기 소음에 청력을 많이 잃은 노동자 아버지의 자조 섞인 가르침과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듯한 데서 일하라"는 노점상 어머니의 바람대로 나는 산재와 거리가 먼, 종군(從軍)만 하지 않으면 '안녕한' 기자가 됐다. 원치 않은 은퇴로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되거나 궁여지책으로 배달일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안녕할 것이다.
그의 죽음은 그의 일이고 나의 삶은 나의 일인데 왜 40년 전 목도한 전기공의 죽음이 아직도 나의 기억 속에 살아있을까. 어려서 표현하지 못한 의문 때문일 것이다.
'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기공을 올려보냈을까?'
'팔을 흔들고 있었는데, 분명 숨이 붙어 있었는데 왜 구조해 살리지 못했을까?'
이보다 백 배는 어려운 질문이 있다.
"어떻게 2025년에도 일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오늘 당신에게 박스를 주고 간 택배기사가 폭염에 쓰러져 끝내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당신이 재촉한 치킨을 싣고 빗속을 달리던 라이더가 사고로 숨져 다른 라이더가 뒤늦게 가져온 치킨을 받는다 해도, 빵공장 컨베이어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두개골이 깨져 사망했는데도 수습 후 바로 재가동 한 컨베이어에 실려 나온 빵을 당신이 먹는다 해도, 당신이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위험한 작업에 떠밀려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했다 해도 당신은 잘못이 없고 법적, 도의적 책임도 없다. '내돈내산'으로 택배를 받고 빵을 먹고 아파트에 살며 음식을 시켜먹었을 뿐이다.
당신이 모르면 된다. 기업도 그러길 바란다. 그들의 죽음이 당신의 삶과 일상과 연결돼 있음을 알면 치킨을 배달시키고 빵을 먹는 것조차 미안한 일이 될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기사의 쓸모가 여기에 있다. 안녕한 언론인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재사망이 일어난 만큼, 일어난 대로 보도하고 있는가?"
아무도 일터에 죽으러 나가지 않는다. 그 옛날 아버지의 말처럼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먹고사는 일은 선택보다 숙명이다. '포도청' 목구멍이 시키는 대로 내몰리다 공사장도 가고 오토바이도 타게 되는 것이다. 이웃도 가족도 심지어 나도 예외일 수 없다. 산재는 '그들'과 '우리'가 따로 없는 '모두'의 문제다. 자식들이 나처럼 부모가 바란 대로 안녕한 일자리를 얻을 거라 장담할 수 있을까. "안전한 일터를 찾으라"는 경쟁만 부추기는 조언과 "안전하게 일하라"는 무책임한 주의가 아니라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게 하지 않겠다!"
이재명정부가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보자는 관망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는 참전이 돼야 한다. 기자의 안녕함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e>가 이 전쟁에 종군하는 이유다.